당신의 고민에 '정답' 대신 '질문'이 필요한 이유
나는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
아직 발행 글이 여섯 개밖에 없는(오늘로 7개 :D) 마음의 정원을 운영하면서 이상하게도 뿌듯하다.
방문자도 없고,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려면 갈 길은 멀다. 그치만 참 애정이 간다.
나는 티스토리에서만 블로그를 세 번을 폐쇄했고 매번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결국 몇 달 못 가 지쳐서 블로그를 닫았다. 그때는 매일 포스팅을 하면서도 전혀 보람이 없고 허무했다.
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
돌이켜보면, 예전의 나는 늘 같은 질문만 반복했다.
“어떻게 하면 블로그로 돈을 벌까?”
자연스럽게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를 블로그 강의로 끌고 갔다.
“블로그로 월 100만 원 버는 법”, “하루 30분 작업으로 월급 버는 블로그 운영법”.
그런 영상들에 낚여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돈이 될 것 같은 글’을 썼다.
키워드 분석을 하고, SEO를 공부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고민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이 안 써졌다.
아니, 억지로 쓰긴 했는데 재미가 없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성공 공식’을 베껴 쓰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블로그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고, 결국… 폐쇄.
세 번째 폐쇄를 하고 나서, 한동안 블로그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계속 실패하고, 같은 고민을 반복하며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지만 결국 답은 나오지 않는 경험. 마치 미로 속을 헤매듯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느낌…
그때 깨달았다. 문제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블로그로 돈을 벌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를 물어야 했다.
질문을 바꾸고 나니, 비로소 보였다.
내가 블로그를 시작했던 진짜 이유는 ‘부업’이 아니라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다는 것을.
유튜브나 숏폼이 아닌, 글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거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도전해보기로 했다.
티스토리 대신 GitHub Pages를 선택했고, SEO 대신 HTML과 CSS를 공부하며,
수익화보다는 자기이해를 주제로 한 진짜 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 막 7번재 글을 포스팅하고 있지만, 이번엔 다르다.
고민하며 글을 쓰고, 글감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배워가며 진짜 내 생각과 마음을 담게 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소크라테스는 왜 답을 주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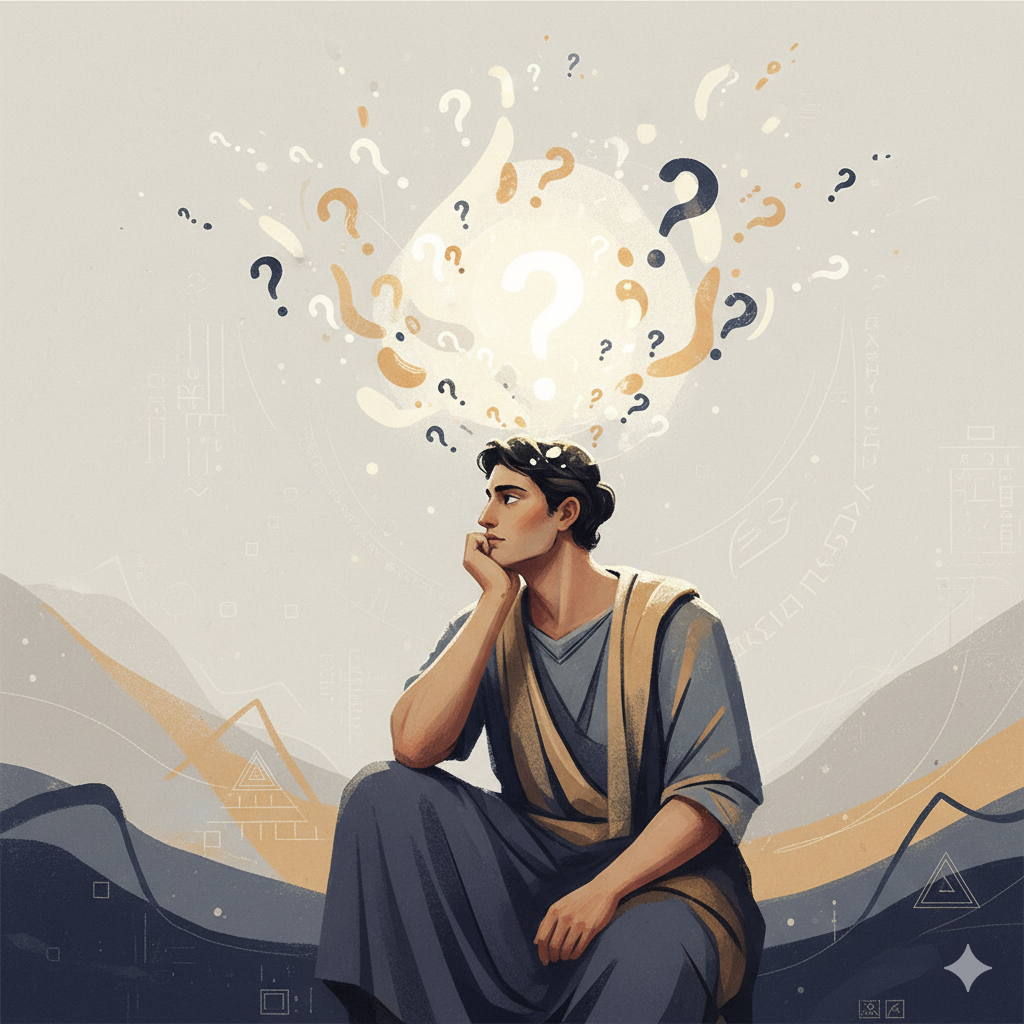
[캡션]깊은 생각에 잠겨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모습 AI Illustration by Gemini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만 던졌다고 한다.
“그게 정말 옳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처음엔 답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답을 찾아냈다.
문제의 본질이 보이면, 답은 저절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하면 블로그로 돈을 벌까?”는 방법론만 찾게 만들었다.
키워드 분석, 포스팅 주기, 제목 작성법. 하지만 아무리 방법을 배워도 블로그는 무너졌다.
그 질문은 내가 진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질문을 바꿔보니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에게 질문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나는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면서 나만의 질문법을 찾아갔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몇 가지 방식이 도움이 됐다.
1. ‘왜’를 세 번 이상 물어본다
표면적인 감정 뒤에는 항상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다.
“블로그 운영이 재미가 없다.”
→ “왜?”
→ “글이 안 써져서”
→ “왜?”
→ “쓰고 싶은 주제가 없어서”
→ “왜 쓰고 싶은 주제가 없을까?”
→ “내가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걸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문제는 HOW가 아니라 WHY였던 것. 어떻게를 묻기 이전에 왜를 먼저 찾아야 했다.
2. ‘만약에’라는 가정을 던진다
“만약 이 블로그로 평생 돈을 못 번다면, 그래도 계속할까?”
“만약 아무도 내 글을 읽지 않는다면, 그래도 쓰고 싶을까?”
가정은 우리를 현실의 제약에서 잠시 자유롭게 만든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된다.
내가 블로그 방향을 바꾼 것도 이 질문 덕분이었다.
“만약 돈이 안 되더라도 쓰고 싶은 글이 있다면, 그건 어떤 글일까?” 답은 명확했다.
자기이해에 대한 나의 이야기였다.
3.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다
“오늘은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가 아니라
“오늘 오후 3시, 키워드 분석을 하다가 갑자기 의욕이 떨어졌다.
이 작업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패턴이 보인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비슷한 방법으로, 내 안의 여러 목소리와 대화하는,
페르소나 심리학을 활용한 내면 회의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질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답이 있다고 믿었다.
누군가는 이미 성공했고, 나는 그 방법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깨달았다.
내 고민에 필요한 건 누군가의 답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WHY를,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먼저 물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심리학 사전: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자기 질문의 심리학
소크라테스식 문답법(Socratic Method)이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던 대화 방식으로, 질문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답을 찾게 돕는 방법입니다.
현대 심리학, 특히 인지행동치료(CBT)에서도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철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질문이 중요한가?
- 자기 발견: 누군가 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스스로 질문하며 찾은 답이 더 깊이 내면화됩니다.
- 인지적 재구성: 같은 상황이라도 질문을 바꾸면 문제 인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블로그로 돈을 벌까?”만 물으면 방법론만 찾게 되지만,
“내가 블로그를 통해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물으면 목표 자체를 재점검하게 됩니다.
어느 질문이 더 나은지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 심리적 주도성: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문제의 ‘피해자’가 아닌 ‘탐구자’가 됩니다.
일상 속 실천: ‘5 WHYs’ 기법
도요타에서 개발한 문제 해결 기법이지만, 자기이해에도 효과적입니다.
표면적인 고민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 ‘왜?’를 다섯 번 이상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시: “회사 가기 싫다”
“왜?” → “업무가 힘들어서” → “왜?” → “의미를 못 느껴서” → “왜?” →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거듭하면,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실천해볼 한 가지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고민을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대신에 계속해서 WHY를 던져보세요.
그 끝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 궁금합니다.